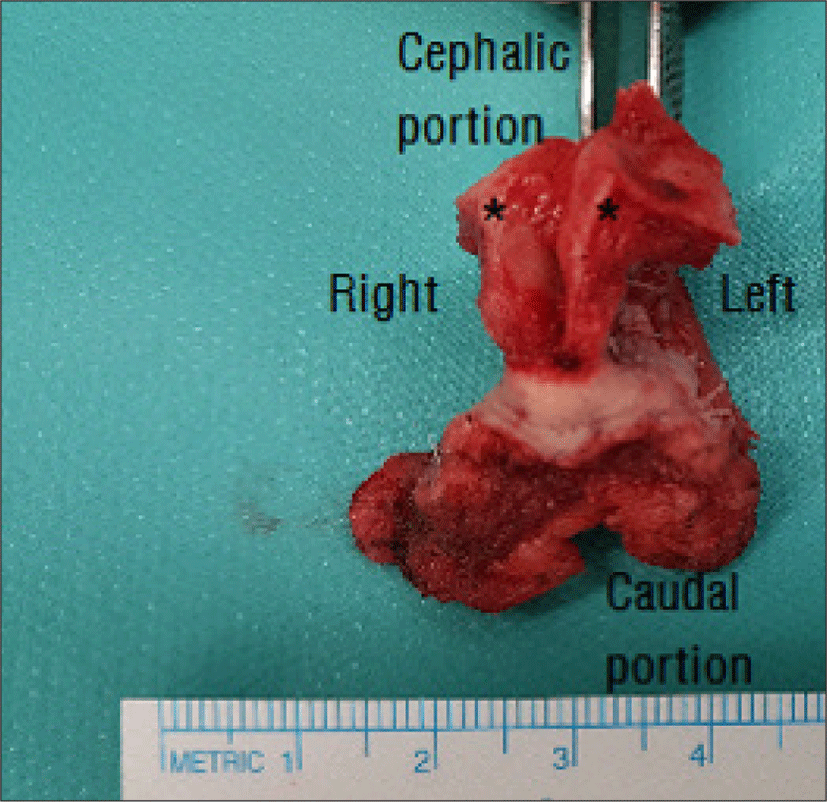서론
비강 및 부비강 내 악성 종양은 전체 악성종양의 1%, 두경부 악성 종양의 5%를 차지한다. 그 중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, 호발부위는 상악동으로 알려져 있다.1,2) 증상은 원발부위에 따라 다양하며 병기를 고려한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되며3,4) 수술 후 피부와 연조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, 피판 재건(flap reconstruction)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. 비교적 성공률이 높으면서 미용적 측면의 장점이 있는 전두부 피판(forehead flap)을 선호하나, 공여 부위 문제 및 주관적인 미용적 불만족이 있고, 결손 부위 위치에 의한 피판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 다른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한다.5-9)
코 끝(nasal tip) 결손에 대한 재건술은 결손부위 크기에 따라 양엽이중전위피판(bilobed double transposition flap)과 비순피판(nasolabial flap)을 이용하며, 위치에 따라 미간부피판(glabella flap), 깃발피판(banner flap)등을 사용하기도 한다.6,8)
저자들은 비중격 전단부에 발생한 편평상피암 수술 후 발생한 코 끝 결손을 재건하고자 양측 비순 회전피판을 사용한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.
증례
84세 남자 환자가 15일전부터 발생한 양측 비전정(vestibule)의 종물 및 통증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였다. 내원 전까지는 스스로 연고 도포를 하였고, 기저력으로는 전립선염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. 외래에서 시행한 비내시경 상 코 기둥(columella)을 중심으로 양측 비전정을 가리는 1.5×1.0×1.0 cm 크기의 종물이 관찰되었으며, 종물 후방의 구조물들은 정상 소견이었다(Fig. 1). 종물은 발적을 동반한 불규칙한 점막 표면을 가지고 있어 비전정 종양 및 화농성 농양을 의심했고, 혈액검사와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(CT) 및 부비동 자기 공명 영상(MR paranasal sinuses)을 시행하였으며, 항생제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하였다. 5일간 경과 관찰하였으나 병변 크기는 변함이 없었고, CRP는 0.3 μ/dL 이하로 정상 소견이었다. 전산화 단층 촬영 상 조영이 증강되어 있는 불규칙한 모양의 종물이 비강 입구와 비중격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,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고신호강도의 병변이 관찰되었다(Fig. 2). 진단을 위하여 부분 마취 하 절제 생검을 시행하였고, 편평상피암(squamous cell carcinoma)으로 확인되었다. 이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술(PET CT) 상 원발 부위 원격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. 치료를 위하여 광범위 절제술 및 이에 따른 결손부 재건을 계획하였다. 종양 제거 후 코 끝 일부와 코 기둥 주변, 인중(philtrum) 좌우 및 아래 1 cm 이상의 광범위한 피부, 연조직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였고, 전두부 피판 및 비순 피판과의 병합 술식을 고려하였으나, 전두부 피판과 결손부 사이 간격이 멀어 닿지 않아 코 기둥과 인중까지의 결손을 재건하기 어려웠으며, 피판 면적이 결손 부위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컸다. 환자는 이마 상처 및 단계별 수술(staged operation)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여 전두부 피판을 원하지 않았다. 또한 고령인 환자는 상대적으로 미용적 요구가 덜하였으며,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순 회전피판(nasolabial rotation flap)을 계획하였다. 전신마취 하에 코 기둥에 외부 절개를 가한 뒤 코 끝에 위치한 주변 조직과 연골을 거상하고, 비중격과 상악골 능선(maxillary crest)을 모두 노출시켰다. 종물의 경계는 양측면 쪽으로는 비익연골(alar cartilage), 미측(caudal)으로는 전정(vestibule), 두측(cephalic)으로는 중격연골(septal cartilage), 상방으로는 코 끝(Fig. 3A), 하방으로는 비저부(nasal floor)까지 경계가 이어져 있었다(Fig. 3B). 양측 비익연골 사이를 절개하여 종물을 분리시켰고, 최소 0.5 cm의 정상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했다(Fig. 4). 비전정 및 미측 중격(caudal septum), 양측 비익 연골의 천정(dome)과 외측각(lateral crus)의 안쪽 1/3 정도가 절제되었고, 인중의 상부 1/3 역시 제거되었다(Fig. 3). 종양 절제부 양측으로 전정, 비익 연골, 저부, 코 끝과 바깥쪽 피부조직에 동결절편생검(frozen section biopsy)을 시행하여 절제면에 침범된 종양세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과 수술을 종료하였고, 성형외과에서 피판 재건을 시행하였다. 결손부를 재건하기 위해 피판의 연장 길이를 측정하였고, 비익 근처에서부터 구순까지의 범위로 전반적인 모양을 도식화(design)하였다. 도플러 초음파를 통한 안각 동맥(angular artery) 확인 후 이를 포함한 양측 비순 주름(nasolabial fold) 주변의 줄기피판(pedicle flap) 형태로 근막피부(fasciocutaneous)층까지 거상하였다. 피판의 끝(tip)을 내측으로 회전시켜 양측이 맞닿게 하여 코 기둥을 재건하였고, 동시에 결손된 인중을 덮어주었다. 공여 부위를 포함하여 피판 봉합을 시행한 후에 수술을 종료하였다(Fig. 5)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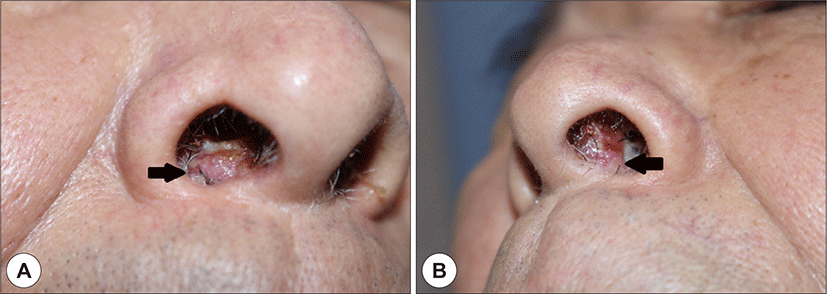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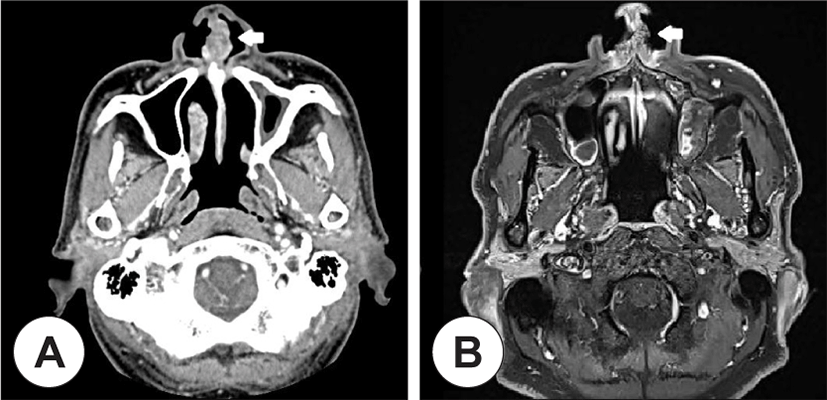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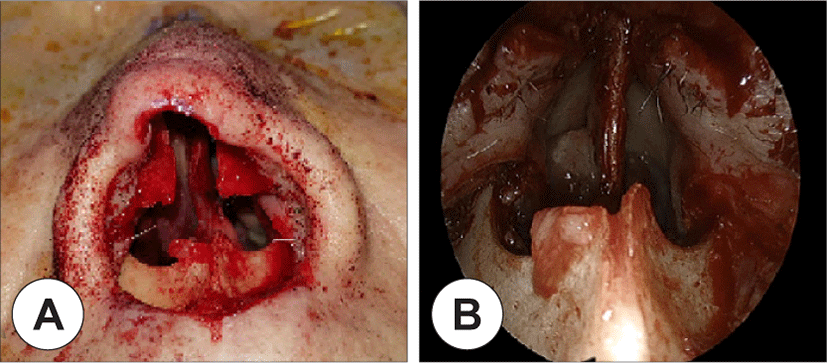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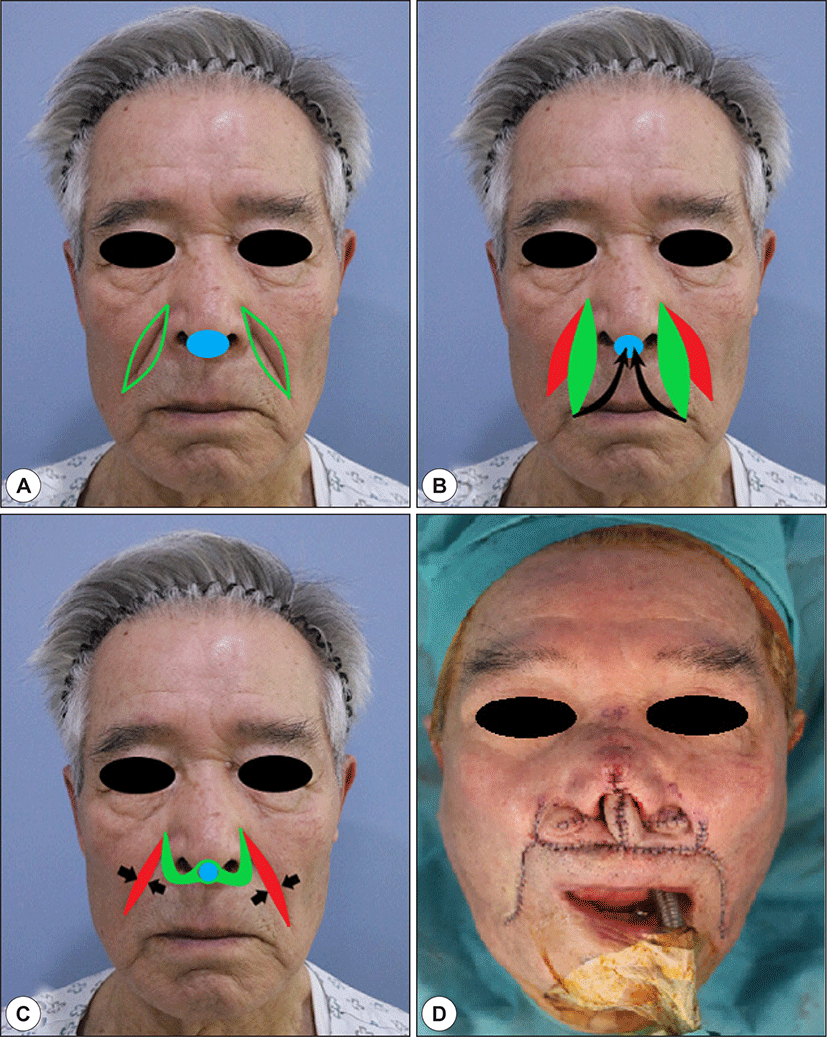
영구조직검사상 비중격에서 유래된 2.5×1.5 cm의 편평상피암으로 최종 확진되었고, 절제면은 모두 음성이었다. 수술 후 6주 뒤부터 7주간 6,600 cGy/33Fx 선량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고, 수술 15개월 후까지 재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(Fig. 6C)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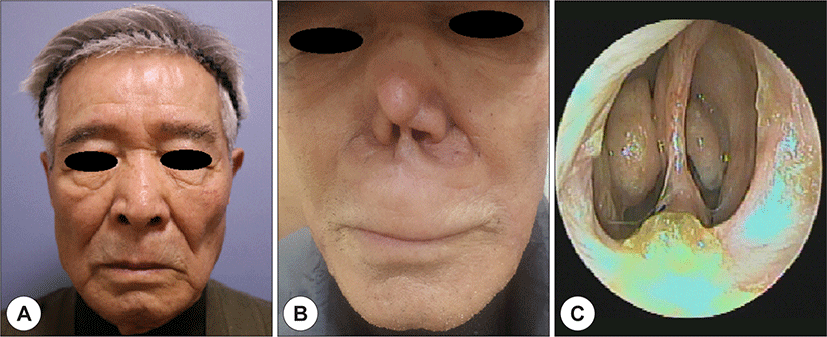
고찰
비강내 편평상피암은 두경부 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, 비중격에서 호발하는 악성 종양은 비부비강 악성 종양 중에서도 대략 9%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.1,10) 증상은 원발 부위 위치에 따라 비폐색, 비출혈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,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되며, 상황에 따라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한다.3,4,11) 수술 시 절제 부위가 코 피부와 연부조직을 포함하는 경우 수술 후 피판 재건을 병행해야 한다. 수술 후 성공률이 비교적 높으며, 미용적인 만족도를 고려하여 전두부 피판이 선호되지만, 재건부위 감염, 괴사 및 주관적인 미용적 불만, 이마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고, 환자의 상황과 원발부위 위치에 따라 단계별 수술(staged operation)이 필요하거나 광범위한 재건 및 양측 전진피판(advancement flap)을 이용한 전두부 재수술과 같은 복잡한 수술이 추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.5,7) 악성 종양 제거 후 발생한 코 끝 결손에 대한 재건술은 결손부위 크기가 작은 경우, 코 끝 외측(lateral nasal tip), 코 하부 외측(lower lateral nose)에 위치하는 경우 양엽이중전위피판(bilobed double transposition flap)을 이용하고, 결손이 큰 경우는 비순피판(nasolabial flap)을 이용한다.6,8) 위치에 따라서는 코의 상부는 미간부피판(glabella flap)과 깃발피판(banner flap)이, 하부는 비순피판을 사용한다.6,8) 전통적으로 비순 피판은 피부색과 입체감이 코 부위와 비슷한 장점으로 주로 코 끝, 코 등, 연 삼각(soft tissue triangle), 비익 재건에 유용하며, 전진(advancement)과 회전(rotation) 및 옮김(transposition) 형식으로 사용될 시 안면 피부 및 구강 주위 피부 재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. 또한 상대적으로 고령이거나 지속적인 양압 환기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되는 술식이다.9,12,13) 코 전정을 포함한 코 중앙의 광범위한 결손에 대하여 주로 양측 비순 피판과 전정부 피판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사용된다.12) 또한 편측 비순 도서형 피판(ipsilateral nasolabial island flap)을 사용하여 코 기둥 결손을 재건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보고가 있으나,14) 본 증례는 보다 더 범위를 연장하여 양측으로 피판을 회전시켜 코 기둥과 인중 및 미측 중격(caudal septum)까지 동시에 재건을 한 경우로 비순 회전피판만으로 충분히 사용하였기에 임상적 의미가 있었다.15,16)
비순 피판의 단점으로 공여 부위 반흔 및 수술 부위 벌어짐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,12) 본 증례의 경우 상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나, 수술 부위 감각이상 및 저작 시 근력저하를 호소하였다. 감각이상은 피판 거상시 주변의 미세한 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사료되며, 저작 시 근력저하는 당시 환자가 구순 상부(upper lip)가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였으며,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발생한 구축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. 술 후 1년 경과 시에 저작 시 근력저하는 호전되었고, 약간의 감각이상이 남아 있었지만 환자는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.
비순 회전피판은 얼굴동맥(facial artery), 입술동맥(labial artery)과 안각 동맥(angular artery)에 의해 혈액공급을 받으며, 이번 증례에서는 안각 동맥이 사용되었다.17) 또한 편측 비순 피판은 구강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어 크기가 작거나 중간 정도의 피복에만 이용되었으나, 양측 피판을 시행하여 구강 비대칭 없이 충분한 크기의 피판을 확보할 수 있었다.12) 주의할 점으로 방사선 치료 1년 후 코 전정 및 비익의 수축(contracture)이 심하게 일어나(Fig. 6B), 비순 피판시 고려할 점으로 초기의 비전정의 재건 크기를 가급적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.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원하지 않았으나 수술 시 전두부 피판을 함께 시행하여 현재와 같은 비익 및 비순 주위 수축을 예방하여 보다 나은 미용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 또한 늑연골(costal cartilage)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코 끝 및 비익 재건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, 본 증례에서는 코 끝을 중심으로 코 등과 인중 방향으로 피부와 연조직 결손이 심하여 연골부를 충분히 덮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, 편평상피암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연골 이식을 보류하였다. 추후 구조적 재건을 보완할 수 있기에 연골 이식(cartilage graft)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.
이번 증례에서는 비중격에서 호발하는 편평상피암이 매우 드문 종양이며, 국내에서도 드물게 보고되었고,11) 악성 종양 제거 후 발생하는 결손에 따른 다양한 재건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, 기존의 전정부 피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, 특히 코 끝에서 인중으로 이어지는 결손에 대해서는 양측 비순 회전피판이 제한적인 적응증을 가지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